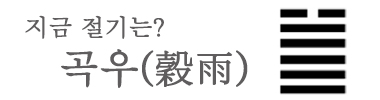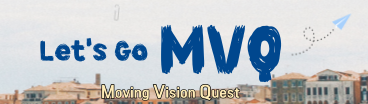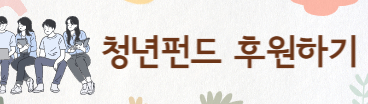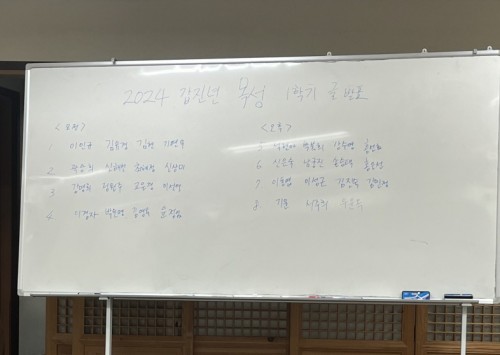4학기 3주차 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퐁퐁 작성일22-11-11 19:59 조회368회 댓글0건본문
4학기 3주차 후기를 뒤늦게 쓴다.
요즘 정말 게을러진 것 같다.
잠도 끊임없이 오고, 책을 펴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린다.
올 한해는 공부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었던 봄, 그때 내 맘은 활기찼는데...ㅋ
어제는 좀 일찍 일어났다. 창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상에 앉아 책을 폈다.
...만, 창 너머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햇빛의 쨍쨍함은 이전에 비해 덜한 것 같다.
하지만 저 은행 나무는 잎이 누렇게 변했을 지라도 아직도 풍성하다. 초록을 잃지 않은 풀들도 보인다.
봄이 와도 초록이 산천을 뒤덮기까지는 지루한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사그라지는 겨울이 왔을 때, 초록 또한 그리 만만하게 자리를 비켜주진 않는구나.
신기하네~
겨울이 싫어서 이런 글을 쓰는 건 아니다. 후기를 쓰기 싫어서 주절거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초록이 지는 게 어느 때보다 아쉽다.
남회근 선생 계사전 하편 1, 2장.
남회근 선생의 글은 언제나 감동이 있다. 이번 장을 읽으면서 와닿았던 것들을 몇 가지 적어볼까 한다.
요즘 아이들을 매질하지 않고 아이와 타협하듯 키우는 풍토를 지적하는 단락.
은혜는 해를 낳기도 하고, 해가 은혜를 낳기도 한다.
매질과 꾸짖음이 잠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렇게 단련된 아이일수록 이후에 쓸모있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단다.
'먼저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다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는 문장에서
우리나라 진돗개들의 양육방식이 연상되었다.
진돗개들은 아이를 낳아 일정 시기가 되면, 산으로 올라가 험한 곳에서 아이를 버리고 온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아이를 기다린다. 무사히 돌아와주길 바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곤경을 이겨내는 경험을 함으로써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인 듯 하다.
돌아보니 나는 아이들을 대할 때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생각했지, 매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음양이 조화되어야 하듯이, 오직 포용과 부드러운 것만으로는 아이를 기를 수 없는 것인가보다.
개들은 때로 사람보다 지혜롭거나, 우리가 예전에는 알았지만 지금은 잊어버린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
달나라에 올라갔다는 상아의 이야기도 나온다.
미국은 자기들이 달에 처음 상륙했다며 떠들지만, 오천년 전 중국의 상아라는 여자가 이미 달에 올라간 적이 있단다.
그러므로 '달은 미국 것이 아니'란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
기상천회하고 허풍 담긴 옛 이야기로만 여기질 않는다.
남회근 선생은 이런 옛 이야기들을 고증할 방법이 없어서 상고사를 연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옛 이야기에 남아있는 역사의 어떤 진실 한 조각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남회근 선생은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이 자기 역사에 대한 자긍심인가.
한국에도 많이 잊혀졌지만 여전히 많은 신화와 전설들이 있다.
거기에 역사의 어떤 진실 내지는, 역사 그 자체가 담겨 있을 텐데.
나도 우리 역사에 대한 그런 유쾌하고 당당한 눈을 견지한다면 좋겠다.
정명(貞明)에 대한 설명도 주옥같았다.
'세상의 어떤 생물은 우리가 소위 광명이라고 부르는 그런 빛을 즐기지 않고, 암흑이라고 부르는 그런 빛을 즐깁니다.'
'밤에 활동하는 생물은 낮에 활동하는 생물보다 적어도 몇 십만 배는 더 많습니다.
인류가 밝은 빛을 즐기므로 태양만이 빛인 줄 알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일 뿐입니다.'
낮은 빛이 있고, 밤은 빛이 없는 상태이지 않나?
남회근 선생은 낮과 밤이라는 것은 빛의 종류가 다른 것이란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다.
단지 철학적 사유만으로 쓸 수 있는 글이 아닌 것 같다.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밤 속으로 깊이 들어가 걸었거나, 오래 주시했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나는 좀 외진 지역에 가서 오래 걷는 여행을 좋아했는데
혼자서 오랫동안 걷기를 통해서 비로소 자연의 어떤 면들이 눈에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회근 선생의 통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이쯤 되니, 밤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도시가 역겨워진다.
우리 집만 해도 가로등 빛이 너무 밝게 들어와서 암막 커튼을 치지 않으면 수면을 방해받을 정도이다.
이러니 밤이 가진, 다른 종류의 빛이 있다는 생각 따위는 평생 하기 어렵지 않은가..
도시는 사람의 팔 다리를 자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은 몸뚱아리도 계속 침범해 손상시키므로써
점점 더 멍청하게, 뒤뚱거리게 만드는 공간이 아닐까?
남회근 선생의 글 중에 주옥같은 문장들이 너무 많아서 다 쓰기가 어렵다.
모니터를 오래 보고 있었더니 눈도 아푸고...
이번 후기는 그냥 나오는 대로 주절거려보았다.
써놓고 보니 공자의 계사전을 해석하는 큰 줄기에서는 좀 벗어나있는, 상념들만 써놓은 것 같아서.. 이런 걸 써도 되는 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만의 감동 포인트 공유라고 이해를..
이건 발제문이 아니니까.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