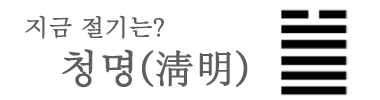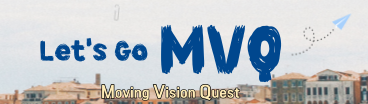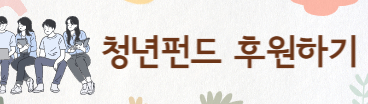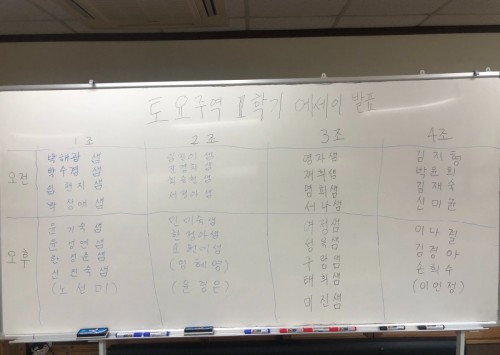[생생(生生) 동의보감] 약의 탄생, 약의 서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이당 작성일21-01-29 12:40 조회1,78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약의 탄생, 약의 서사
하수오(何首烏) 〇원래 이름은 야교등(夜交藤)인데 하수오라는 사람이 먹고 큰 효과를 본 데서 하수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이 사람은 원래 몸이 약하였고 늙어서도 아내나 자식이 없었다. 하루는 취해서 밭에 누워 있는데, 한 덩굴에 두 줄기가 따로 난 풀의 싹과 덩굴이 서너 번 서로 감겼다 풀렸다 하는 것이 보였다. 마음에 이상하게 생각되어 마침내 그 뿌리를 캐어 햇빛에 말려 짓찧은 다음 가루 내어 술에 타서 7일 동안 먹었더니 성욕이 생기고 백일이 지나서는 오랜 병들이 다 낳았다. 10년 후에는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고 130살이나 살았다. (‘초부’, 「탕액편」, 2067쪽)
약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보면 약은 본래 따로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수오도 원래 이름은 야교등이다. 이 풀이 밤에 활동하는 것을 누군가 관찰했을 것이다. 그래서 야교등이란 이름을 붙였을 게다. 하지만 아직 약은 아니었다. 야교등을 약으로 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하수오라는 남자가 술에 취해 밤에 풀밭에 누웠던 모양이다. 몸이 약하여 아내를 맞이할 여력도 없이 쓸쓸히 늙어 간 이 남자. 밤에 술 몇 잔 걸치고 딱히 갈 데도 없어 벌렁 풀밭에 드러누워 한 잠 잤을지도 모르겠다. 깨어서 물끄러미 어떤 풀, 야교등을 바라보게 되었다. 아주 우연히. 그런데 이 풀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잎과 줄기가 엉겼다 풀렸다를 반복하면서 말이다. 마치 남녀가 교합을 하듯이. 더구나 잎은 반드시 한 줄기에서 쌍으로 나 있다. 남녀 한 쌍처럼. 마침내 하수오의 기분이 이상해졌으리라.^^
아들을 여럿이나 낳고 130세까지 살았다 하니 이 풀 약효가 대단하다. 그리고 드디어 약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이젠 야교등이 아닌 ‘하수오’로 불려지게 된다. 약으로서의 이름을 얻은 것이다. 이처럼 약은 처음에는 어떤 서사와 함께 탄생한다. 그것도 우연히, 또 아주 가까이에서. 모든 약은 병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 보다. 우리가 병이 있는데도 그에 대응하는 약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까이 있는 친숙한 것을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연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인연에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무조건 먹어보고 실험해보면 될까? 하수오처럼 늘 행운을 만나는 건 아니다. 독을 만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지장(地漿, 누런 흙물) 성질은 차고, 독은 없다. 중독되어 답답하고 괴로운 것을 풀어준다. 또한 여러 가지 중독을 풀어준다. 산에는 독버섯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삶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또한 단풍나무 버섯을 먹으면 계속 웃다가 역시 죽는데 이런 때는 오직 지장수를 마셔야 낫지 다른 약으로는 구할 수 없다. ( ‘수부’, 「탕액편」, 1834쪽 )
야외에 나갔을 때 이런 변을 당할 수 있다. 모처럼 소풍을 와서 버너에 불을 피우고 보글보글 찌개를 끓일 때 우리를 유혹하는 소보록한 버섯. 독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다소곳하다. 하지만 독이 있어 죽기도 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보곤 한다. 옛날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더 희한한 건 버섯을 먹고 웃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 참 세상엔 별의 별 병이 다 있다. 그런데 이 때도 약이 있다는 게 또 신기하다. 역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바로 옆의 누런 흙탕물. 지장수다. 병은 희한한데 약은 너무 평범해서 정말?하고 의심이 들었는데 실제로 『대동야승』이라는 문헌에 이 사례가 나오는 걸 보고 놀랐다. 『동의보감』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게 된다. “유월 유둣날, 부녀자들이 단속사로 떼 지어 물 맞으러 갔다가 점심이 되어 밥을 지었는데 누군가가 따 온 버섯으로 국을 함께 끓여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모두들 웃음이 나기 시작하는데 게걸게걸 웃다가 부둥켜안고 뒹굴면서 웃고, 온종일 웃음이 멎지 않았습니다.”(『음양이 뭐지?』, 전창선·어윤형, 세기, 178쪽에서 재인용) 이걸 보고 치유의 메니저로 나선 사람은 이 절의 노승이다. 그는 단풍나무 고목에서 돋아난 버섯을 먹은 게 분명하다며 약을 지어주었는데 그걸 먹자마자 아낙들은 웃음을 그쳤다. 그 약은 바로 비온 뒤의 산길 발자국에 고인 흙탕물을 달인 것이었다. 노승은 “이 산에서 병을 얻었다면 그 병을 낫게 하는 약도 반드시 이 산의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천지 조화의 섭리”라고 말했다. 병과 약은 반드시 공존한다는 것. 그리고 천지만물이 다 약이라는 뜻이다. 버섯은 웃음이 끊임없이 나오게 한 것으로 보아 밖으로 나온 양기(陽氣)로 볼 수 있다. 계속 웃는다는 것은 몸이 양기에 치우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산 어딘가에 음기(陰氣)가 있고 그것이 바로 약이라는 것이다. 노승은 비온 뒤의 물을 음기로 보았다. 병이 양기일 때 약은 음기이고 병이 음기일때 약은 양기가 된다. 음양은 하나에 공존한다는 원리를 응용하여 음양의 조화를 처방으로 삼았다. 이 경우엔 하수오와 달리 노승이 약을 탄생을 도와주는 메니저 역할을 했다. 하수오의 메니저는 술인 셈이다.

천지만물이 다 약이지만 나와 인연이 닿지 않으면 아직 약이 아니다. 그래서 인연을 만들어주는 서사가 중요하고 그 서사를 만들어주는 메니저가 소중하다. 요즘은 인터넷도 메니저 역할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내가 이사 와서 사는 집 바로 맞은 편에는 한 그루의 멀구슬나무가 있다. 제주에서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다. 우리 마을의 한 가운데 자리 잡아 여름이면 노인들이 앉아 소일하는 장소다. 나는 어릴 때 무료하면 자주 우리 동네 멀구슬나무에 올라갔었고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구슬 같은 열매를 따먹어도 보았는데 들큰하여 별로 맛이 없었다. 그래선지 이사와서도 이 나무에 별 관심이 없었다. 바람이 불면 이파리가 온통 우리 돌담으로 밀려와 궁시렁거리며 쓸긴 하지만 그래도 울창하여 바라보기 좋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 나무가 약재라는 걸 최근에 알았다. 나는 사주에 화기운이 많고 일간도 병화여서 열이 뜨는 편이다. 포도주 한 잔 정도에도 당장 피부가 건조해진다. 심할 땐 두피에 딱지가 앉기도 한다. 그런데 우연히 네이버에서 이 나무를 보았다. 열매 달인 물이 두피에 좋다고 한다. 얼른 『동의보감』을 보니 모든 충(蟲)을 죽이고 대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고 한다.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약이라고? 며칠 전 폭설에도 별로 떨어지지 않고 찌락찌락 풍성하게 매달려 있는 염주같은 열매들. 막바로 한 되박 주워다가 사나흘 말린 뒤 어제 처음으로 머리를 감았다. 아직 효능은 잘 모르겠지만 나도 하수오처럼 갖출 것은 다 갖추었다. 바로 가까이 있고 우연히 발견했고 인터넷과 동의보감, 메니저를 둘이나 만났고 자주 나뭇잎을 쓸고 거의 매일 나무 아래를 지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서사가 아닌가^^
이제 하수오처럼 오래 복용하고 기다릴 일만 남았다. 하수오도 10년 넘어 아들을 낳았다지 않는가? 물론 일주일 만에 효능이 나타난다면야 행운이겠고. 멀구슬 나무의 열매가 나의 약으로 탄생되기를 기다려 보겠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