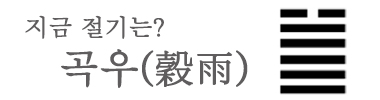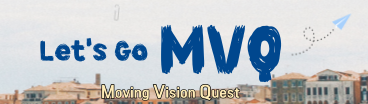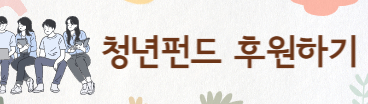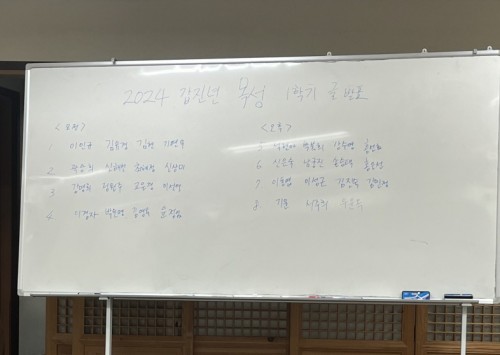[유식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이름(名言)은 욕망이다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이당 작성일21-04-05 19:28 조회79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이름(名言)은 욕망이다 (1)

존재와 인식 사이, 이름
10여 년 전 『금강경』을 읽었을 때 ‘시명(是名)’이란 말이 가장 와닿았다고 했다.(‘유식불교를 만나다’편 참조) ‘시명’은 ‘그 이름’이란 뜻이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이다.’, ‘큰 것은 큰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세상은 수많은 이름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았다. 아니 세상은 이름 자체였다. 무엇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름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심지어 맛보는 것조차 이름이 개입하고 있었다. 모든 인식에는 인식한다는 자각이 생기는 순간 이미 ‘무엇’이라는 이름이 개입하고 있었다. 그냥 본다고? 그냥 듣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존재와 그것을 인식하는 사이에는 ‘이름’이라는 것이 거대한 환영(幻影)처럼 끼어 있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세상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안 것뿐인데, 내 몸과 마음은 여태 경험해보지 못한 큰 기쁨과 자유로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평소 명상을 조금씩 해 오던 터라, 명상 중 또는 일상생활 중 희열을 체험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강경』의 ‘시명’을 사유하면서 세상이 모두 이름일 뿐이라는 자각에서 촉발되었던 기쁨과 자유로움은 명상 시 느꼈던 희열과는 달랐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었다. 돈을 더 번 것도, 명예를 더 얻은 것도, 자식이 더 잘된 것도, 고민하던 일상의 문제에서 벗어난 것도, 심지어 날씨조차 그대로였다. 그런데 ‘시명’을 사유하면서 촉발된 기쁨과 자유의 느낌은 몇 주가 지나도록 지속되었다. 세상은 그대로인 듯했으나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넓고 가볍고 밝고, 무엇보다 그 자체로 너무나 고요했다.

그때 직감했는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괴로움(苦)에서 해방되는 길은 결코 외부에 있지 않음을. 외부의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 것과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자식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식과 관련된 많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남편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남편과 관련된 많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다른 수많은 괴로움도 그러함을. 아무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내일’을 창조함으로써 비롯된 인간의 괴로움은, 그 ‘내일’이 오로지 이름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함으로써 해방될 수 있음을.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이름’이란 것, 즉 언어를 만들었을까? ‘살아남기 위한 본능은 인류에게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언어를 활성화시키기 시작’(‘인간의 괴로움, 그 근원을 찾아서’편 참조)했다. 언어의 활성화는 유식으로 보자면, 명언종자의 활성화이다. 그러니 ‘어떻게 언어가 만들어졌을까?’는 ‘어떻게 명언종자가 생겨났을까?’와 같은 질문일 수도 있겠다.

유식에 의하면 식(識), 즉 마음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의타기성(依他起性),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이 그것이다. 먼저, 마음은 다른 것(他)에 의존(依)하여 일어나는(起) 성질이 있다(依他起性).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 아닌 다른 것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음은 다른 것과 별도로 따로 존재(그 자체로 자성을 가진 실체로서의 마음)하면서 저 혼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존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참 알기 어렵다. 근데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아무것도, 그야말로 인식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면 마음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면,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생각하는 것이든,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무엇(대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말나식과 제6의식, 전오식은 근본식인 아뢰야식을 인(因)으로 한다지만, 인식할 수 있는 외부의 대상(緣)이 없다면 마음, 즉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 마음은 두루 분별한(遍計) 것(所)에 집착(執)하는 성질이 있다(遍計所執性)는 것이다. 다른 것에 의존해 일어난 마음은 그 다른 것이 어떤 것이든 처음과 끝을 분별하여 ‘그것’이라고 집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딸기를 보기 전엔, 딸기를 냄새 맡기 전에, 딸기를 촉감하기 전엔, 딸기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다가(어떤 대상도 없을 때는 마음이 있는 줄 모르다가), 보는 순간, 냄새 맡는 순간, 감촉하는 순간, 타(他)(봄, 냄새, 감촉)에 의존해서 그것을 아는 마음이 생기고(依他起性), 이와 동시에 딸기의 모양, 냄새 또는 촉감이 다른 대상과 구별되는 지점(딸기 형상의 시작과 끝, 딸기 냄새의 시작과 끝, 딸기 감촉의 시작과 끝)을 두루 헤아려(遍計) 딸기라는 물(物)을 다른 것과 분리되는 어떤 것으로 잡는(執) 마음도 함께 생긴다는 것이다(遍計所執性).

이에 의하면, 마음은 늘 대상에 의해 일어나고, 일어나는 순간 그 대상을 ‘무엇’이라고 잡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렇게 마음이 분별하여 잡은(遍計所執) 대상에 ‘이름’을 붙인다. 모호한 형상(대상)의 시작과 끝을 이미지로 잡은 후 그것에 ‘딸기’라고 이름 붙인다는 것. “변계소집성은 주로 언어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된다.” 즉 “어떤 대상을 구별한다는 것은 언어가 반드시 개입한다.”(『유식삼십송과 유식불교』 김명우 지음, p215) 언어는 분별을 위해 사용된다. 보편적 형상을 갖는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같은 이름을 붙여 보편적인 것으로 의미화(行蘊)’하는 인간의 능력이 ‘이름’을 만들었다.
이름 붙여 대상을 의미화 하는 인간의 능력은 인간에게 수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줬다. 지금의 문명은 그 의미화덕분이다. 그런데 인간의 수많은 괴로움도 바로 이런 의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미화한 것은 아뢰야식에 훈습, 저장되고, 이렇게 저장된 것은 다음 찰나에 세상을 해석하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늘 새롭게 그리고 무상(無相)하게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인간은 찰나찰나 새롭고 무상하게 변해가는 세상을 ‘이름’으로 붙잡는다.
욕망하는 것에 붙여진 ‘이름’
인간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수많은 것들 중 어떤 것을 보편화하여 의미를 부여할까? 외부 세상은 매 찰나 변해간다. 우리의 인지 능력은 순간순간 변해가는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없다. 감각기관의 제한된 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각기관으로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인지하며 지내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

이는 12연기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12연기법은 붓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무상정등정각’을 얻을 때 깨달은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모든 생겨남(生)은 있음(有)에 의존(依)하고, 있음은 취(取)에 의존(依)하고, 취는 애(愛)에 의존한다고 한다. 그리고 애는 느낌(受)에 의존하고, 느낌은 외물과의 닿음(觸)에 의(依)해 일어난다고 되어 있다.(12연기의 다른 부분은 생략) 붓다는 태어남(生)과 늙음(老), 병듦(病) 그리고 죽음(死)의 네 가지 괴로움(四苦)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자 했는데, 그 원인은 감각기관(六入處)이 외물(대상)과 닿은 후(觸)에 그것을 애착(愛,取)하는 마음 때문이란 것을 알았다. 애착이 모든 ‘있음(有)’을 만들고, 이 ‘있음’이 결국 ‘무엇’이라는 탄생을 만든다는 것. 이에 의하면,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한 것들 중 우리가 애착하는 것만을 포착하여 있음(有)을 만들고, 이 있음은 결국 생겨남(生)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은 생겨난(生) 것들이다. 생겨나지 않은 것에는 이름이 없다. 12연기법에 의하면, 이 생겨남은 감각적 느낌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착은 우리가 좋음으로든 싫음으로든 집착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다. 욕망은 좋은 것에도 작동하지만 싫은 것에도 작동한다. 싫음은 좋은 것을 유지하려고 좋지 않은 것을 밀어내는 마음일 뿐이니까. 이 욕망의 마음이 이름을 만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의미를 부여하여 기억하려는 욕망이 이름을 만드는 것이다.
 밤과 아침 사이 그 작은 틈조차 인간은 자신들이 애착하는 것에 이름을 붙였다.
밤과 아침 사이 그 작은 틈조차 인간은 자신들이 애착하는 것에 이름을 붙였다.생각해보라. 우리는 욕망하지 않는 것에는 이름을 짓지 않는다. 이는 우리 주변의 각종 이름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각종 나무에는 따로 이름들이 있지만, 그 나무들의 두 번째 가지의 10번째 나뭇잎에는 따로 이름이 없다. 감나무 두 번째 가지의 10번째 잎의 이름을 아는가? 다른 모든 잎과 마찬가지로 그저 감나무의 잎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감나무의 두 번째 가지의 10번째 나뭇잎이 정력에 (아~~주) 좋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 그 나뭇잎에는 수많은 이름이 지어질 것이다. 어찌 이름뿐 이겠는가. 감나무 잎에 대한 신화와 함께, 감나무 자체에 대한 연구, 감나무의 두 번째 가지에 대한 연구, 열 번째 잎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연구 등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인도철학사』에 보면 인간이 신을 만드는 과정을 알 수 있는데, 그 중 ‘우샤스’는 새벽의 신이다. 캄캄한 밤을 지나고 동이 트는 새벽이 얼마나 강렬하고 그것을 열망했는지 새벽에 신의 이름을 부여할 정도였다. 우샤스는 “모든 종류의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는 구조자”(『인도철학사』 라다크리슈난, p122)이다. 밤의 두려움이 지나 먼 동이 트는 새벽은 밤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밤과 아침 사이 그 작은 틈조차 인간은 자신들이 애착하는 것에 이름을 붙였다. ‘소마’라는 신도 있다. 그것은 먹었을 때 도취되는 느낌과 함께 지극히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식물에 주어진 이름이다. ‘아그니’는 불의 신, ‘인드라’는 천둥, 번개의 신. 인간과 따로 신이 있어 신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애착하는 것(대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절취하여 그것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감각기관에 감촉한 것 중 애착하게 되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였다. 이 이름은 애착의 기억과 함께 아뢰야식에 저장되고, 우리는 아뢰야식에 저장된 기억과 함께 다음 찰나의 세상을 본다. 그리고 이름 붙여진 모든 것은 ‘그 이름(是名)’으로 인해 이름에 걸맞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 채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