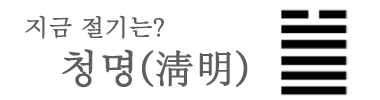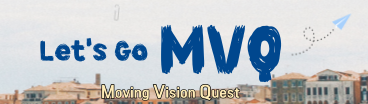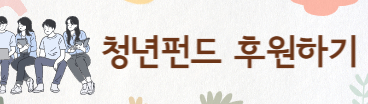[2019 금성] '위버멘쉬'를 위한 전사의 탄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헌 작성일19-07-19 15:19 조회3,509회 댓글0건본문
‘위버멘쉬’를 위한 전사의 탄생
안상헌(금요대중지성)
1883년과 1884년. 니체의 나이 39세에서 40세. 그의 대표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하 『차라』)가 저술된다. 이 책의 주인공 ‘차라투스트라’는 니체가 추구하고자 했던 새로운 인간 유형이다. ‘차라투스트라’의 말과 노래로 쏟아져 나오는 이 책은 니체의 대표작인 만큼 그의 철학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경전 같은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위버멘쉬로 가는 길’을 가르치고자 한다. '차라투스트라의 가르침'을 따라 ‘위버멘쉬’로 가는 길로 나아가려면 니체 자신이 이 길을 열어간 과정에 우리도 익숙해져야 한다.
방랑 철학자
총명했던 니체, 특히 언어와 음악에서는 탁월했던 니체. 그는 1869년 4월(25세) 박사학위도 없는 조건에서 스위스 바젤 대학의 고전문헌학 담당 원외교수로 위촉되고, 1870년 4월 정교수가 된다. 그만큼 당시 고전문헌학 분야에서 매우 주목을 받았던 니체였다. 그렇지만 니체가 고전문헌학자가 아닌 철학자로서의 삶을 살게 한 첫 작품, 『비극의 탄생』(1872년)은 당시 고전문헌학계에서는 혹평을 받았다. 이 책에서 고대 그리스 비극을 주목한 니체는 앞으로 자신이 만들어갈 철학은 그 자체가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 후 니체는 『반시대적 고찰』(1873-1875년)과 같은 글을 50편정도 쓰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그려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4편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1879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바젤 대학을 떠나기까지, 10년 정도 고전문헌학 교수로 재직한다. 그는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퇴직 직전 휴양을 이유로 떠난 제네바에서 시작된 니체의 방랑 생활(혹은 휴양 여행)은 비젠, 장크트모리츠, 베네치아, 질스마리아, 메시나, 로마, 타우텐부르크, 나움부르크, 라이프치히, 제노바, 뮌헨, 플로렌츠, 니차 등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의 여러 곳으로 이어진다.(니체 연보, 책세상)
니체는 이렇게 고정된 연구실도 안정된 일상의 삶도 보장되지 않는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 알프스의 신선한 공기와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온화한 공기를 찾아 다녔지만, 그의 건강이 특별히 좋아지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이 방랑의 기간 동안 니체는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계속했다면 나올 수 없는 ‘문체’와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니체 철학’을 생성해 낸다. 그리고 그는 당시를 이렇게 돌아본다.
그 당시 내게 결정적이었던 일은 바그너와의 결렬이 아니었다—나는 내 본능이 총체적으로 길을 잃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바그너나 바젤의 교수직 같은 개별적인 실책은 그 총체적인 길 잃음에 대한 징후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 자신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돌연 나를 엄습했다 : 이때 나는 다시 내 정신으로 돌아오기에는 지금이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했다.(『이 사람을 보라』, 407-408).
혈기 왕성한 시절 열렬히 추종했던 바그너와의 결렬. 회복되지 않는 건강. 안정된 삶과 명예를 보장하는 교수직에서의 떠남. 그렇게 시작된 방랑 생활을 통해 니체가 사유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 혹은 ‘본능’의 발견을 통한 ‘자기 정신의 회복’이었다고 훗날 니체는 고백한다. 그 시기 니체의 삶에 닥친 난관과 질병은 개인의 것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시작된 방랑 생활에서 길어 올린 그의 사유는 니체만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니체가 현대인의 삶에 던진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다. 방랑자 니체는 ‘영원한 것’과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실제로는 마음과 생각에 건강하지 못한 병들을 가득 지닌 채, 왜소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니체는 ‘영원하고 안정된 것’을 찾지 말고, 대신 삶에 ‘영원한 활기’을 찾을 것을 주문한다. 안정과 정주가 삶의 목적이 된 현대인들에게 방랑자가 겪는 매일 매일의 ‘낯설고, 새롭고, 불편한 것’들은 그들의 삶을 불안하고 무겁게 할 것이다. 하지만 방랑자는 이 ‘낯설고, 새롭고, 불편한 것’들은 그 자체가 삶이되고, 이것들로부터 각자의 삶의 활기를 찾아낸다.
자기 관찰력
1858 여름 슐포르타 입학 시험을 준비하면서 첫 자서전을 쓰기 시작한다. (…) 나의 교육은 전적으로 내가 알아서 해야만 했다. (…) 인격을 갖춘 남자의 지도가 나에게는 없었다. 이후 10년 동안 여덟 개의 자서전을 쓴다.(『니체』, 뤼디거 자프란스키 / 오윤희 역, 528)
14세에 자서전을 쓴 니체. 이후 10년 동안 여덟 개의 자서전을 쓴 니체. 이런 니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니체의 특성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할 것이다. ‘외톨이’, ‘고독자’, ‘부적응아’ 등등. 하지만 니체를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삶에 대한 철학적 의미가 너무 크다. 하여 니체의 이러한 특성을 탁월한 자기 관찰력으로 이해해보면 어떨까? 이러한 관점은 니체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침놀』, 『즐거운 학문』 등에서 2,300개 이상의 ‘아포리즘’이라는 형식의 글을 썼고, 이를 통해 현대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깊고 넓게 파고들어가 우리에게 펼쳐 보인 그의 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시기 아포리즘 형식의 글은 니체가 어른이 된 후 쓴 또 하나의 철학적 자서전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물론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유용한 내용과 그 형식은 그 누구의 자서전과도 비교 불가하다! 니체는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이 극복해낸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했고, 때론 죽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것은 너무나 유쾌한 작업”(『인간적』, 『아침놀』, 『즐거운 학문』 서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니체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본성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 자기 자신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자유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내 본성에 속하지 않는 것들에서 나를 해방시켰던 것이다. 내게 속하지 않는 것이란 이상주의다 : (…) ‘자유정신’이라는 말은 여기서 어떤 다른 의미로도 이해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 자유정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시 소유하는 자유롭게 된 정신인 것이다(『이 사람을 보라』, 404).
이 시기 니체는 아포리즘이라는 문체를 통해 현대인의 민낯을 잘 드러내고 있다. 니체가 보여주는 우리 삶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찰력은 놀랍다. 니체가 드러내는 우리의 민낯을 처음 볼 때는 부끄럽지만, 내가 그 민낯을 스스로 보는 힘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면 왜소한 내가 아닌 조금은 두툼한 나를 보는 즐거움도 있다. 니체는 현대인들의 삶이 무기력한 것은 자기 관찰력의 결여에 있다고 말한다. 니체가 자신을 해방시킨 방식은 이상주의와의 결별이다. 니체가 해방되고자 했던 것은 삶에 구체적이고 가까운 것들이다. 예를 들면 "영혼의 구제, 국가에의 봉사, 학문의 발전, 또는 전 인류에 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망과 재산 등"과 같은 이상이 아니다. 니체가 추구한 해방은 "개개인의 욕구, 24시간이라는 생활에서 대두되는 크고 작은 필요"에서의 해방이다.(『인간적 Ⅱ, 224』) 이렇듯 니체가 자기 관찰을 통해 깨달은 것은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하루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곧 그가 추구하고자 한 자유정신이다.
그림자들과의 싸움
‘방랑 생활’과 ‘자기 관찰’을 통해 힘을 키운 니체는 『차라』에 와서 우리에게 ‘위버멘쉬’에 이르는 법을 가르치고자 한다. 니체 스스로 『차라』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즐거운 학문』에서 그는 그림자들과의 새로운 투쟁을 선언한다. ‘위버멘쉬’를 위한 전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관문이다.
새로운 투쟁.―신은 죽었다. 그러나 인간의 방식이 그렇듯이, 앞으로도 그의 그림자를 비추어주는 동굴은 수천 년 동안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그리고 우리는―우리는 그 그림자와도 싸워 이겨야 한다!(『즐거운 학문』, 183)
신은 죽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신의 대체물들이 있을까? 우리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각자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속에 있을 것이다. 누구는 아직도 연민의 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종교적 삶에, 누구는 정의로운 국가와 제도를 위해 살아가다 작열하는 불꽃과 숯이 되어버린 단단한 삶에, 누구는 절대로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진리와 앎의 갈구에, 누구는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열광시키지 못하는 도덕에, 누구는 우리를 생존 그 자체의 정당화에 영원히 머물게 하는 행복 추구(『차라』, 19)에 각자의 그림자들이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은 19세기 유럽과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작동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정신의 난쟁이들’이다. 이제 우리는 이 그림자들과 싸워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이 싸움의 과정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내 눈에 비친 이웃들의 삶과 세상을 동시에 위버멘쉬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니체를 따라 이렇게 선언할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 성숙한 어른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지상의 나라를 원한다.”(『차라』, 519) 그렇다! 이제 우리는 ‘차라의 가르침’을 따라 지상에서 어떤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존재, 지상에서 어떤 것이든 키워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길에 나서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어두운 밤과 깊은 몰락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때론 사다리와 계단이 필요하겠지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