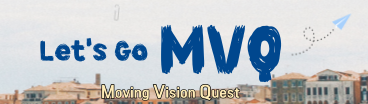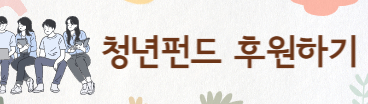[중한그몸] 동의보감의 서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류시성 작성일13-07-21 20:59 조회3,362회 댓글1건본문
드디어 지난 시간, 『동의보감』읽기를 시작했다. 언제 끝이 날 지 알 수 없는 대장정이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볍다. 이 두꺼운 책을 여기가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 다시 읽어보랴. 그렇다. 지금-여기서 해야 한다. 안 그럼 책값은 너무 아깝고 책은 흉기가 될 거다. 개인적으로 연구실에 처음 오면서 『동의보감』을 읽고 싶었다. 오로지 내 한 몸 명철보신하자는 인생관을 가진 나로서는 내 한 몸을 챙기는 데 저 책만한 것이 없다고 믿었다. 그래서 읽고 싶었으나 무려 5년이 걸려 본격적으로 읽을 기회를 얻었다. 이 어찌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내 마음을 더 요동치게 만든 건 청나라 학자 능어가 쓴 서문이었다. 그의 『동의보감』 사랑은 그야말로 눈물겹다. 베껴 쓰고, 황제에게 바치고, 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가도 잊지 못했다. 돈이 없어 자비로는 도저히 세상에 출판할 수 없었던 그가 친구의 도움으로 『동의보감』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의 심정. 그는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천하의 보물을 천하와 더불어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아! 이 기쁨. 『동의보감』의 다른 서문들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이 환희에 찬 감정. 난 그것이 왕에게 올리는 책이기에 절제와 절제를 거듭했던 허준의 서문,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든다. 뭐 십수년을 했는데 그것이 나오는 것이 무슨 대수랴. 그냥 그런 일이 있을 뿐. 그것 또한 허준의 마음은 아니었을지. 사람이란 누구나 그렇지 않은가.
책 앞에서 천하를 운운할 줄 아는 책벌레와, 그것을 쓰기 위해서 500권이 넘는 의서를 '발제(?)'해야 했던 글쟁이. 어찌 보면 독자와 필자. 대국의 관료와 변방 오랑캐의 의사. 이 좁힐 수 없을 것만 같은 두 사람의 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도 멀어보이지 않는 것일까. 아마도 『동의보감』 때문일 것이다. 그것과 만나면 느끼게 되는 기쁨, 혹은 무덤덤함. 이것이 책에 그대로 담겨 있기에, 그것을 담으려했기에 그들은 너무나도 가까웠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이 징글 몸서리가 나는 책을 읽으며 그 격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될까. 모를 일이다. 오직 지금-여기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만 빼고는...^^ 그 출사표와 같은 의미로 능어의 서문을 남겨둔다.
p.s. 다음 주엔『동의보감』목차를 읽는다. 목차만 무려 100여 페이지가 넘는 책. 이런 책을 어디가서 만나보랴.
청나라 능어(凌魚)가 쓴 서문
“동의보감은 이에 명(明)나라 때 조선의 양평군(陽平君) 허준이 지은 것이다. 조선 사람들의 시속을 살펴보면 평소부터 문자를 알아서 독서하기를 좋아하였는데, 허준의 집안은 또한 선비의 세족(世族)이다. 만력년간에 봉(篈), 성(筬), 균(筠)의 세 형제들이 모두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고, 그의 여동생 경번(景樊, 난설헌)도 글재주로 이름이 났는데 그의 오빠들보다 더욱 뛰어나 주변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걸출한 자였다. 동의(東醫)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나라가 동쪽에 있으므로 동(東)이라고 말한 것이다. 옛적에 이동원(李東垣)이 『동원십서(東垣十書)』를 지어 북의(北醫)로서 강소성과 절강성에서 행세하였고, 주단계(朱丹溪)는 『단계심법(丹溪心法)』을 지어 남의(南醫)로서 관중(關中)에 나타났다. 이제 양평군 허준이 치우쳐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에 능히 책을 지어서 중국에까지 읽히게 하였다. 말은 족히 전할 것을 기약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 한계를 두는 것은 아니다. 보감(寶鑑)이라고 말한 것은 왜일까? 햇빛이 새어나와서 오래된 어둠이 풀리듯이 기육(肌肉)을 나누고 주리(腠理)를 갈라서, 사람으로 하여금 책을 열면 분명히 빛나는 것이 마치 거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옛적에 나익지(羅益之)가 『위생보감(衛生寶鑑)』을 지었고, 공신(龔信)이 『고금의감(古今醫鑑)』을 지었는데, 모두 감(鑑)으로 이름을 붙였으나 과장하였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내가 가만히 일찍이 논하건대, 사람은 오직 오장(五藏)이 있고, 병은 칠정(七情)에 그친다. 그 사이에 품부 받음이 치우치고 온전함이 있고, 병사가 점차 물듦에 얕고 깊음이 있고, 증상 변화에 통하고 막힘의 두 가지 증후가 있고, 맥의 움직임에 부·중·침(浮·中·沈)의 삼부(三部)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밭이랑처럼 가름이 있는 것이니 가히 넘을 수가 없는 것이며 들불처럼 타올라 가히 덮을 수 없다. 대황(大黃)이 가히 정체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알면서 가운데를 차갑게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자(附子)가 허한 것을 보충시키는 것은 알면서 독기를 남기는 것을 알지 못하니, 구제할 바가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인(至人)은 병이 일어나기 전에 치료하고, 이미 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스리지 않는다. 병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비로소 치료하는 것은 하책(下策)인데도 다시 용렬한 의사들에게 맡겨 판결시키니 어찌 낫겠는가. 심지어 사사로운 이익에 마음을 둔 자가 질병이 없는 사람을 치료하여 공적을 만들려 하고, 처음 이에 종사하는 자들은 환자들을 이용해서 공부하려고 한다. 『주역(周易)』의 약을 쓰지 말라는 점사(占辭)와 남인(南人)들은 항심(恒心)이 없다는 경계가 마치 일찍이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덮개를 떼버리는 것 같은 것이다. 옛날에 편작(扁鵲)이 ”사람이 병으로 여기는 것은 질병이 많다는 것이고, 의사가 병으로 여기는 것은 병자들의 도(道)가 적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황제(黃帝)와 기백(岐伯) 이후 대대로 명의들이 나와서 지금에 이르러 저술이 번성해져 거의 한우충동(汗牛充棟)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적음을 걱정할 일은 아니고, 의술에 효과가 있음과 효과가 없음이 있을 뿐이다. 어찌 옛 사람들이 각기 본 바대로 학설을 삼을 것인가? 선택함이 정미롭지 못한 자는 말이 상세하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는 자는 도의적이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자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고자 하면서 그 사람의 뜻과 소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책을 보건데, 내경편(內景篇)을 먼저로 하여 그 근원으로 소급해 올라갔고, 외형편(外形篇)을 다음으로 하여 그 막힌 것을 소통시켰고, 잡병편(雜病篇)을 다음으로 하여 그 증후를 변별하였고, 탕액편(湯液編)과 침구편(針灸篇)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방법을 정했다. 이 가운데 인용한 것은 『천원옥책(天元玉冊)』으로부터 『의방집략(醫方集略)』에 이르기까지 80여 종에 이른다. 대체로 우리 중국의 책들이고 조선의 책은 3종뿐이었다. 옛사람이 이룬 방법을 따르면서 능히 신통하게 밝혔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빠진 것들을 보충하고 사대(四大:地水火風)에 밝은 양기를 베풀었다. 편집을 끝내고 궁궐의 황제께 올려 국수(國手:이름난 명의, 뛰어난 사람)로 추천되었지만 책이 간직된 비각(秘閣:궁중서가)을 돌이켜보니 세상에서 엿보기 어려웠다. 전에 차사(鹺使) 산좌(山左) 왕공(王公)이 건절(建節)에 월(粵)에 발령받아 가서 당시 의사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음을 근심하여 전문가를 수도에 보내어 베끼도록 하였다. 그러나 간행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떠나고 말았다. 순덕(順德)의 명경(明經) 좌군(左君) 한문(翰文)은 내가 총각 때부터 교유한 사람인데, 이를 안타까이 여겨 인쇄하여 널리 전할 것을 생각하였다. 3백여 민(緡)의 돈을 썼지만 조금도 아끼는 안색이 없었다. 대체로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사물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일은 양을 고르게 하고 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 천하의 보물을 마땅히 천하와 더불어 하고자 한 좌군(左君)의 어짊이 크도다. 판각이 끝난 뒤에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니 드디어 기뻐서 그 단서를 기록한다.건륭(乾隆) 31년 병술(丙戌, 1766) 7월 상순에 원인 호남소양예릉흥녕계양현사 충경오임신계유병자사과 호광향시동고관 번우(番禺) 능어(凌魚)가 쓴다.
댓글목록
예진님의 댓글
예진 작성일히익~ 웬 벼슬이름이 저리도 긴지요. 대국은 뭔가 달라도 다른듯?! 잘 읽었습니다. <조선사람 허준>과 더불어 귀한 자료 감사해요^^